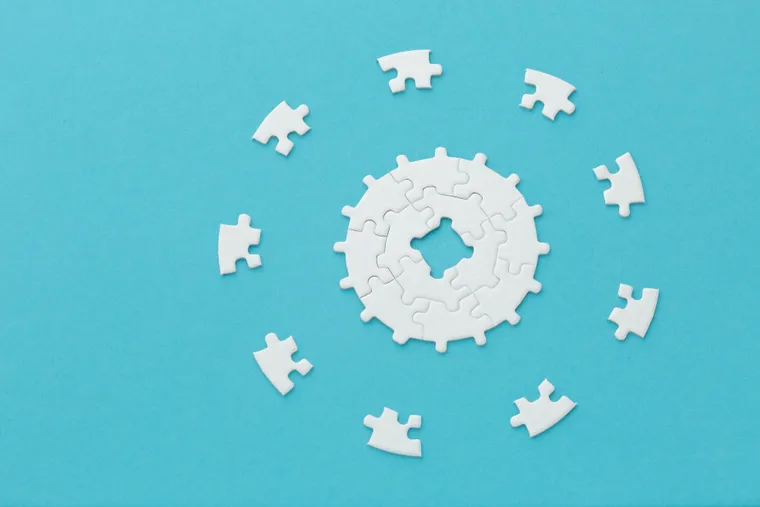100여 년 전, 러시아의 한 대학 실험실에서 파블로프는 개의 침샘을 뚫어서 음식이 위로 들어갔을 때 분비되는 소화액의 과정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챙겨주는 사육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개의 침샘이 갑자기 활성화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파블로프는 음식과는 무관한 ‘종소리’를 엮어서 침샘을 자극하였고, 개들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조건반사’ 이론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 메커니즘의 실마리를 푸는 놀라운 발견으로 이후 학습이론과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행동 치료 발전에 이정표가 되었다.
조건반사에 담긴 함의는 인간의 고등 정신활동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중에 조건 지어지고 조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 메커니즘도 사육사의 발자국 소리나, 무의미한 종소리에 자극되는 개의 침샘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우리의 일상은 스마트폰과 같은 우리 자신들을 자극하는 온갖 것들에 묶여있다. 순간 순간 침샘을 자극하는 달달함이 우리의 일상을 꽉 채우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있다. 뇌 관점에서는 이것을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조건 반사적 행동으로 점철된 일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해답은 해체의 과정과 리셋이다. 종소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조건의 완전한 소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 안 좋은 말과 행동, 습관이 쉽게 재발 하는 이유다. 따라서 소거와 함께 새로운 신경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즉, 자각된 인식 위에 행동을 통한 새로운 습관 형성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
일상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이것은 자신을 객관화하여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메타인지는 우리를 성숙으로 안내하는 길잡이다. 인간의 의식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표출된다. 자극과 반응, 그 사이에 의식의 질이 존재한다. 생존, 관계, 성장, 성숙과 통찰, 진화된 의식이 그 안에서 꿈틀거린다. 무수한 공간이 그 사이에 있다. 따라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극을 잘 주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간극이 좁을수록, 여과 없이 즉각 반응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의 동물성에 의존하게 된다. 생존 수준의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조건 지어진 수많은 미성숙한 나를 반복적으로 분출할 뿐이다. 따라서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사이를 살펴보는 힘은 아주 중요하다.
어떤 이는 삶의 목표가 ‘이고득락(離苦得樂)’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통을 회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 동기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다. 인간이 동물성을 넘어 인간다운 삶,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직시하고 즐거움을 경계하는 메커니즘을 동시에 장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나’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씨앗이 움튼다.
C.E.O James Roh (노상충)